
|
[에너지경제 최용선 기자] 생수 판매가 합법화된 1995년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 생수 시장은 말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 2002년 233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는 10년 만인 2013년 54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수돗물 불신에 따른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샘물시장 규모는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 성장세에 맞춰 생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대형 마트들도 자사브랜드(PB)를 단 생수를 앞 다퉈 내놓고 있다.
28일 한국샘물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수브랜드는 모두 100여개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먹는 물 시장은 올 초 기준으로 광동제약 제주삼다수가 시장 점유율 40.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시스는 8.0% 정도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아이시스 이외에 백두산하늘샘, DMZ청정수 등을 포함해 생수시장 점유율이 18.3%에 달했다. 농심의 백산수는 5.0%로 단일 브랜드로선 3위 수준이다.
해태는 평창수, 진로는 석수, 풀무원은 샘물, 남양유업은 천연수 등을 주력으로 생수시장에서 마이너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20여년에 걸친 소비자 기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수에 대한 원가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한 수원지에서 퍼낸 물이 다른 브랜드를 달고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연천군, 충북 옥천군 소재 취수원에서 뽑은 샘물이 상표만 바꿔 달아 여러 제품이 유통 중이다. 이는 제조원인 기업과 판매원이 다른 유통구조 때문이다.
제조원인 P사가 각각 3개사에 주문자 상표를 달아 납품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판매가 역시 500ml 기준으로 격차가 2배에 이르는 등 제각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증대에만 몰두하다보니 브랜드 별로 품질 차이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에 제조원가가 얼마 들지 않아 적정 판매가를 평가하는 것조차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떄문에 샘물 사업자를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평가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생수의 경우 수원지에서 퍼낸 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생산되고 있다. 일단 취수원을 확보하면 병 값, 뚜껑 값, 취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생수를 만들 때 드는 돈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수 제조원가는 100원도 안 될 것"이라면서 "취수를 위해 관정을 뚫은 뒤에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 아주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수 원가는 생수 업계 내에서도 대외비로 특별 관리하고 있어 확인 할 수는 없다.
이 관계자는 "업체들의 하루 취수량은 정해져 있고 일정 양을 취수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이 양만 취수하면 이익을 보게 된다"며 "생수 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생수 가격에는 로열티, 유통, 홍보, 물류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생수시장은 당분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비앙·볼빅·아이슬랜틱 등 수입산 생수시장 규모도 연간 150억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테마주 ‘들썩’] “이 종목 왜 올라?” 12월부터 치열했던 대권 후보군 테마주](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50326.28ca58edbd064ccd9a0963b1fdc0b95c_T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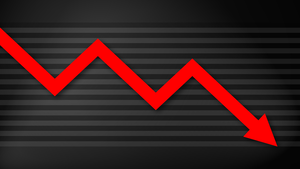


![“10조원, 산불복구도 못해”...벌써부터 ‘추가 추경’ 고개 [전문가 진단]](http://www.ekn.kr/mnt/thum/202503/20250331023012151.png)
![[두산그룹 新청사진]④ 에너빌리티, 투자재원 마련 고심…해법은 이번에도 ‘밥캣’](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41112.a5b55e18fca649db893187907c05e037_T1.jpg)

![[김성우 칼럼] 트럼프 2기 기후정책 어디로 가나](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이슈&인사이트] 이웃을 거지로 만들고 있는 무역정책](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40318.a08eb2bb1b6148bdbbc5277847497cdf_T1.jpg)
![[김병헌 칼럼]서민경제, 더욱 잔인한 4월이 오는가?](http://www.ekn.kr/mnt/thum/202503/news-a.v1.20240625.632a59702fa1403793738702bdf2322a_T1.jpg)
![[기자의 눈] 급격한 전력시장 변화 바람, 부작용 최소화해야](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50331.90b732bdde0e40bf87d7271299537143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