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 6900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지난해 말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지만, 막상 주위에서 전기차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한달 전쯤 우연히 집 앞을 걷다가 ‘파란색 전기택시’를 봤다. 오늘만 해도 ‘전기차 혁명이 이미 시작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전기차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낯선 개념이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10년새 10배 이상 성장했다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4330대에 불과하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머무는 상황.
이웃나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전기택시로 돌아가보자.
2014년 9월 10대가 시범 도입된 후 현재 서울시내에 운행 중인 전기택시는 총 60대다.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가 7만여 대이므로 전기택시를 만날 확률은 0.085%다. 집앞에서 전기택시를 만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던 셈이다.
21억 원을 들여 보급한 이렇게도 귀한 전기택시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전기택시는 주행거리가 일반택시의 4분의 1에 그치고 그마저도 겨울에는 반토막이 난다. 전기히터를 틀면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80km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일산에서 강남까지의 거리가 대략 40km 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도 충전을 한 번 이상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충전도 골칫거리다. 충전소가 43곳이지만 변변한 안내 표지판도 없다. 밤 10시 이후에는 충전소 절반이 문을 닫고, 고장난 곳도 많다. 전기택시 기사들은 충전소를 찾지 못해 견인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소연한다.
설상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전기 충전비를 유료로 바꿨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영업 시간이 짧고 수리비용도 3배 가까이 비싸 전기택시를 울며 겨자먹기로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전기택시, 하지만 지원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범사업 의무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부터는 이 전기택시를 서울에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만두겠다는 택시 기사들도 많다. 대대적인 지원책이 있어도 힘든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기택시를 운행할 기사는 없다.
비단 택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주말 통과된 환경부 예산에서도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한 예산을 140억 원 삭감했다. 깎인 예산은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돌려졌다.
물론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충전소 문제인 만큼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전기차는 값비싼 배터리 가격 탓에 지원금 없이 선뜻 구매에 나서기 힘든 제품이다. 미국의 테슬라도 중국의 비야디(BYD)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 성장했다.
보급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정된 예산을 두고 이리저리 돌려막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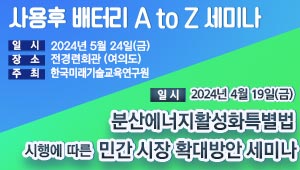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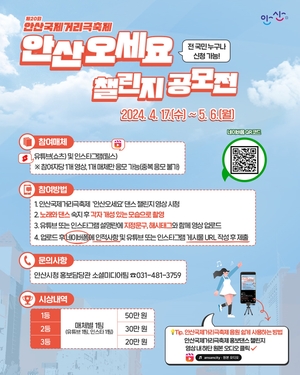







![[이슈&인사이트] 대만지진과 TSMC사태, 한국은 어떤가?](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8.c9e3396caf5f449aa9bcadddb9b63428_T1.jpg)
![[이슈&인사이트] 겉멋만 부리는 산업안전, 안전 걸림돌돼서야](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226.33c2fac19c374e3a9156ba578e81eb81_T1.jpg)
![[데스크칼럼]‘안미경중’과 이별을 확실히 할 시간](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4.c3942d2968994de3ac3d7c51e0cc2ddf_T1.jpg)
![[기자의눈] 소액주주 지분이 두 배더라도 이길 수 없는 K-주총](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6.33dadd76960b4656a9901e7ab6a794f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