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부 신보훈 기자 |
전 산업 분야 어디를 들여다봐도 ‘친환경’은 단골손님이다.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먹거리 등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퍼져있다.
건축물 또한 마찬가지다. 냉난방, 조명 등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다보니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와 기술 적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은 국내 건축물은 올 2월 기준 2899건이다. 본인증 이전에 받게 되는 예비인증은 5317건이 등록돼 있다. 녹색건축 인증은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 의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친환경 건축물 강자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한 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허한 수식어라는 지적이 많다.
친환경 건축물 확산이 더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동기의 부족이다. 온실가스를 절감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비싼 돈을 들여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친환경 건축물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아직까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 받는데 친환경 기술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굳이 예산편성을 높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수요자들의 친환경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 아파트에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건축물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교통환경, 교육환경, 집값 상승 가능성이지 친환경성이 아니다. 전기료 또한 선진국에 비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도의적 수준에서 에너지 절약은 하더라도 반드시 절약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어느 친환경 건축 전문가 말을 빌리면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건물이 없고, 공공건물에서는 3개 층 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생활 속 불편함 보다 에너지 절감이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이다.
이제는 도의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기업, 수요자들이 당위적 필요성으로 친환경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에너지 아파트는 빛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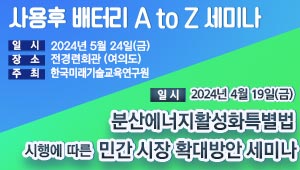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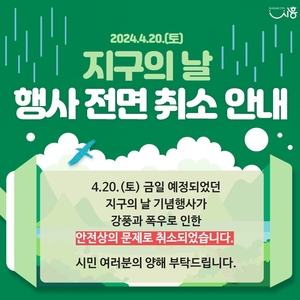





![[이슈&인사이트] 대만지진과 TSMC사태, 한국은 어떤가?](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8.c9e3396caf5f449aa9bcadddb9b63428_T1.jpg)
![[이슈&인사이트] 겉멋만 부리는 산업안전, 안전 걸림돌돼서야](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226.33c2fac19c374e3a9156ba578e81eb81_T1.jpg)
![[데스크칼럼]‘안미경중’과 이별을 확실히 할 시간](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4.c3942d2968994de3ac3d7c51e0cc2ddf_T1.jpg)
![[기자의눈] 소액주주 지분이 두 배더라도 이길 수 없는 K-주총](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6.33dadd76960b4656a9901e7ab6a794f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