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
1백년 전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10년 전인 2007년엔 스마트폰 혁명(아이폰)이 첫 선을 보였다. 60년 전엔 ‘인공의 별’인 스푸트니크가 우주 공간으로 인간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150년 전엔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 1권이 출간됐다. 5백년 전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선언문인 ‘95개조 반박문’을 게양했다.
2017년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인류역사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을 기념하며 그 긍정, 부정의 에너지와 창의성과 용기를 회고하고 교훈을 얻으려 했다. 이런 2017년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연 올해 우리는 어떤 성취와 혁신을 이룩했을까? 10년, 60년, 1백년, 5백년 후에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요한 혁명과 성취 혹은 기념비적인 사건들로 기록될 일들이 과연 있는 것일까?
지난 해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보다는 파괴적이고 광기어린 에너지로 인해 좌절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대답은 대단히 우울했다. 현재의 세계가 지극히 자극적이고 증오적이며 분절적인 이익에 집착한다는 비관론이 많았다.
실제로 증오와 갈등이 점철된 지구촌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지성이 폄하되고, 공동체가 공격당하고 있고, 대의가 실종되고, 정치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과학, 기술, 종교를 막론하고 엘리트들이 대중과 시민의 품격과 의식 수준을 따라 오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트위터와 포플리즘으로 세상에 광풍을 몰고 오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달려가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의 장기집권이 분명해 보인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의 미얀마는 상의 의미를 배신하는 소수민족 탄압을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고, 통합과 관용의 상징이었던 유럽연합은 브렉시트와 카탈루냐 등의 분리투표, 유럽 내 극우주의의 대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일본은 역사 망각 놀음을 계속하면서 주변국과의 화해와 미래보다는 자국 중심적 사고와 과거의 영광에 더 매몰된 듯하다.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 체제 이행기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지구상 거의 모든 체제에서 과거 인류 진보의 역사적 성취물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성취의 결과 만들어진 제도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에너지가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소진됐기 때문인가? 사회악과 권력의 구조가 너무나 공고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시민의 행동, 개인의 자각이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미리 굴복하기 때문인가?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어법에 공을 들이지 않고, 진실을 믿지 않으려 하며, 대의를 영웅의 일로 버려두라는 유혹과 압력 혹은 의기소침하게 하는 무언의 협박 때문인가? 시선을 마주하고 작은 대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려 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너무도 쉽게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데 분노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분위기 때문인 지, 해외에서 만난 각국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접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구한 한국의 촛불혁명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동적 참여와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무의 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다시 일깨우는 일을 한국의 ‘촛불’이 했다는 평가들이다.
2017년 시민들은 타락한 정권은 몰락시켰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움직이게 했던 동기가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2017년 종반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이런 위기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역설적인 해석을 믿고 싶다. 추석 연휴기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2017년 촛불의 성취가 2018년엔 진정한 개혁과 긍정의 에너지로 작동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2026 통신 전망] 5G시장 포화에 알뜰폰 추격 압박…빅3, AI로 답 찾을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103.c1ec7ab30d754cf085d317bdc14e1d18_T1.jpeg)


![[2026 산업 기상도] AI 훈풍 반도체 ‘수출 맑음’, 보호무역·캐즘에 소재·완성차 ‘흐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1.5d0acc91aba24c3491cc224784be5dc2_T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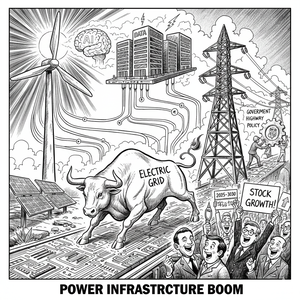

![[EE칼럼] 에너지와 경제성장, 상관을 넘어 인과를 묻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EE칼럼] ABCDE + FGH](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고환율 정부 대책 변명만 남았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다크 팩토리와 어쩔수가 없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50326.21b3bdc478e14ac2bfa553af02d35e18_T1.jpg)
![[데스크 칼럼] 검증대 선 금융지주 지배구조, 증명의 시간](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8.c6bb09ded61440b68553a3a6d8d1cb31_T1.jpeg)
![[기자의 눈] 수요 예측 실패 신공항, ‘빛 좋은 개살구’ 못 면한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9.e0265cfa33b54f1bb40c535f577994b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