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부 송진우 기자 |
친(親)노동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사관계 ‘잡음’이 마치 하나의 유행이라도 된 듯, 산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소식이 있는 곳에 기자가 간다는 말마따나 취재 방향은 자연히 노사 간 집요하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파고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노동조합은 주장한다. 그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행보라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경영진의 무능함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언제나 마무리는 ‘친(親)노동 정권’을 운운한다. 마치 문장의 마침표라도 되는 것처럼.
이에 경영진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입을 굳게 다문 정도는 거세진 노동조합의 기세만큼이나 우직하고 굳건하다. 공식입장이란 건 애초에 불변(不變)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 마냥 꺾이지 않는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과 해와 나그네’ 동화 속에서 길 가던 나그네가 거센 바람과 폭풍에 옷매무새를 꽉 붙드는 장면과 자못 닮았다.
취재란 명목으로 둘 사이에서 이어지는 설왕설래(說往說來)를 듣고 있자면, 이를 단순히 한철 앓고 지나가는 성장통 혹은 한층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인고의 과정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진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치고 오가는 대화에서 회사란 건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회사 사정은 양측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각자 입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경영난, 자금난으로 회사가 힘든 관계이므로…"란 문구는 글의 서두 혹은 말미 어디에서든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이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그칠 뿐, 적극적인 교섭과 접점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 간 내홍으로 인해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회사 상황은 간과한 채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만 바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교섭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노사 간 간극은 더 크게 벌어지며, 회사는 내·외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간다.
‘노사(勞使)’관계가 언제부터인가 ‘No사(社)’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실감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기업 임금결정진도율(타결률)은 48.8%로, 2015년 대비 무려 10.5%p 낮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임금협상 타결률이 36.2%에 불과하다. 곪은 고름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노동자와 사용자 간 옥신각신으로 한강의 기적이 낳은 회사들의 등 터질 날이 멀지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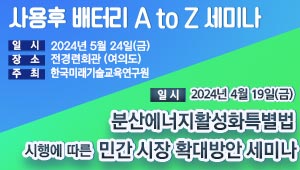












![[이슈&인사이트] 대만지진과 TSMC사태, 한국은 어떤가?](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8.c9e3396caf5f449aa9bcadddb9b63428_T1.jpg)
![[이슈&인사이트] 겉멋만 부리는 산업안전, 안전 걸림돌돼서야](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226.33c2fac19c374e3a9156ba578e81eb81_T1.jpg)
![[데스크칼럼]‘안미경중’과 이별을 확실히 할 시간](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4.c3942d2968994de3ac3d7c51e0cc2ddf_T1.jpg)
![[기자의눈] 소액주주 지분이 두 배더라도 이길 수 없는 K-주총](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16.33dadd76960b4656a9901e7ab6a794f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