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 문제로 철거 공사시 방진·방진·방음벽 설치 어려워
- 기준 있어도 현장마다 적용 범위 달라
#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 앞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불만이 많다. 실제로 학원 사무실이 있는 3층에서 맞은편 철거 현장을 확인해 봤다. 먼지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는 근로자 한 명과 사람 키의 2배에 달하는 방진·방음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소음 속에 먼지가 피어 올랐다. A씨는 "지금은 그나마 살수 작업을 요청해서 발생하는 먼지가 줄어들었지만 전에는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심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철거가 끝난 곳은 방진·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은 먼지가 발생하는 데도 왜 방진·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철거 현장과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방지책의 당국의 손발이 안 맞아 현장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원이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2018년 연구과제로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건설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부터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터널식 세차시설과 공사장 입구 워터커튼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 클린업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철거 현장은 총 12곳이며 이주 및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48곳이다.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현장은 비산먼지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시설 설비의 수준이 들쑥날쑥이다.
◇ 기술적 한계로 설치 어렵고, 담당 부서도 따로따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작업 때 설치해야 하는 방진·방음 시설의 최소 높이 기준은 1.8m다. 그나마 건축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공 현장에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지만 철거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건물 철거시 벽면 때문에 방진·방음벽 설치가 어렵다. 또 시공 현장의 방진·방음벽 설치는 건설사의 소관이지만 같은 현장이라도 철거 구역의 방진 대책은 철거 업체의 몫이다. 또 철거 기간이 시공 기간보다 짧아 신고해도 적기에 처리되기가 어렵다. 게다가 규제 부서와 감시 부서가 따로 논다.
비산먼지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는 "기준은 정부 부처가 만들지만, 기준 이행 확인은 각 지자체의 몫"이라며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받을 때 방지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주체도 각 지자체의 환경과"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런 기준은 대규모 현장에나 적용된다. 소규모 건축장의 경우는 확인 주체가 환경과가 아닌 지자체 건축과로 바뀐다. 마포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3000가구 이상의 현장만 지자체 환경과가 관리하고 그처럼 대규모 정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건축과"라며 "서울의 경우 대규모 공사 현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강풍이 불어 현장 방진막·방진벽 등이 넘어가 인명 피해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방진막·방진벽의 높이를 올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산먼지와 소음 방지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셈이다.
- 기준 있어도 현장마다 적용 범위 달라

|
▲마포구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최아름 기자) |
#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 앞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불만이 많다. 실제로 학원 사무실이 있는 3층에서 맞은편 철거 현장을 확인해 봤다. 먼지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는 근로자 한 명과 사람 키의 2배에 달하는 방진·방음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소음 속에 먼지가 피어 올랐다. A씨는 "지금은 그나마 살수 작업을 요청해서 발생하는 먼지가 줄어들었지만 전에는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심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철거가 끝난 곳은 방진·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은 먼지가 발생하는 데도 왜 방진·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철거 현장과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방지책의 당국의 손발이 안 맞아 현장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원이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2018년 연구과제로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건설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부터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터널식 세차시설과 공사장 입구 워터커튼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 클린업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철거 현장은 총 12곳이며 이주 및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48곳이다.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현장은 비산먼지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시설 설비의 수준이 들쑥날쑥이다.
◇ 기술적 한계로 설치 어렵고, 담당 부서도 따로따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작업 때 설치해야 하는 방진·방음 시설의 최소 높이 기준은 1.8m다. 그나마 건축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공 현장에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지만 철거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건물 철거시 벽면 때문에 방진·방음벽 설치가 어렵다. 또 시공 현장의 방진·방음벽 설치는 건설사의 소관이지만 같은 현장이라도 철거 구역의 방진 대책은 철거 업체의 몫이다. 또 철거 기간이 시공 기간보다 짧아 신고해도 적기에 처리되기가 어렵다. 게다가 규제 부서와 감시 부서가 따로 논다.
비산먼지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는 "기준은 정부 부처가 만들지만, 기준 이행 확인은 각 지자체의 몫"이라며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받을 때 방지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주체도 각 지자체의 환경과"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런 기준은 대규모 현장에나 적용된다. 소규모 건축장의 경우는 확인 주체가 환경과가 아닌 지자체 건축과로 바뀐다. 마포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3000가구 이상의 현장만 지자체 환경과가 관리하고 그처럼 대규모 정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건축과"라며 "서울의 경우 대규모 공사 현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강풍이 불어 현장 방진막·방진벽 등이 넘어가 인명 피해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방진막·방진벽의 높이를 올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산먼지와 소음 방지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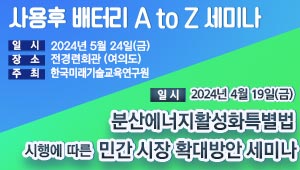












![[EE칼럼]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재추진 논의 시작해야](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이슈&인사이트] 현실적인 건설 근로자 보호방안은?](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318.2b3e839a23144cd3b7ed701cfa3b2110_T1.jpg)
![[데스크 칼럼] 두바이 폭우는 ‘기후행동’ 외면의 대가](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21.6526aaf290d445929a54ee8aa200a7d4_T1.jpg)
![[기자의 눈] 은행주의 급등,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http://www.ekn.kr/mnt/thum/202404/news-p.v1.20240423.eb069905ecf34fd8922f826b4510c96f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