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지난 6월 30일 KT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7인을 선임했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후보가 주총을 앞두고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아직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았지만 그래도 한시름 덜었다. 이번에 선임된 KT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훌륭한 분들을 모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보통 사외이사 후보명단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진 위원회가 후보군 내에서 사외이사를 선발한다. 이번에 KT는 이런 업계의 관행에서 벗어났다.
KT는 지난 4월17일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 회사와 관련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주주다. 그러므로 주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사회라는 것이 다양한 주주 그룹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직이 아니다. 주주의 성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런 방식은 ‘콩가루 이사회’가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사는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그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력하되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사는 전문성이 우선이고, 대표이사를 감독할 만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표이사의 하수인이 돼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의식해서인지 KT TF는 주주 추천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써치펌) 추천 후보를 포함해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꾸렸다고 한다. 다만 굳이 써치펌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써치펌은 헤드헌터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190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 풀을 가진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100%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고 한다.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인선자문단이 1차 평가를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해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사외이사 선임 과정과 이사회 구성이 거의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참 구차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외이사 선발과정은 단순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외이사 선임에 회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KT가 금융지주회사처럼 소유가 분산된 기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대부분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사내이사는 1~3명에 그치는 구조도 금융지주회사와 똑같다.
필자는 이런 형식에 찬동하지는 않는다. 한국 상법과 시행령이 세계에 유례가 없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 결격사유 등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규정하여 간섭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기업 이사회는 사외이사보다는 사내이사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어떤 법률에서도 KT 등 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 대부분의 기업 이사회(대략 80%가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구성)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내용을 잘 모르는 사외이사보다는 IT전문가들인 실무형 기술자를 이사진에 포진시키고 사내이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기술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시대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2001년 민영화 이후 성년이 된 KT는 이제 홀로 서야 할 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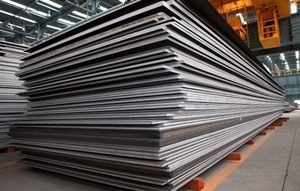



![[EE칼럼] CES 2025가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방향](http://www.ekn.kr/mnt/thum/202501/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이슈&인사이트]스타트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의 대안으로 해야](http://www.ekn.kr/mnt/thum/202501/news-p.v1.20240325.a19a6b33fb5c449cadf8022f722d7923_T1.jpg)
![[데스크칼럼] 미-중 ‘희토류戰’ 임박,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http://www.ekn.kr/mnt/thum/202501/news-p.v1.20250112.71743bb635de4320bc38f35105baf8c8_T1.jpg)
![[기자의 눈] 비대면 주담대 제동 건 법원의 등기시스템](http://www.ekn.kr/mnt/thum/202501/news-p.v1.20240603.9db479866b4d440e983ca217129dfcfe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