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8월 중 상정하면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김은지 기자)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지난 5년간 5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2758곳, 총 이용자는 492만명에 달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19만명이었고, 이후 시기에는 1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기간은 13만명, 완화된 기간은 14만명, 전면 허용 이후에는 18만명 수준이었다.
진료 건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22만 건(전체 외래진료의 0.3%), 이후 시기 17만건(0.2%)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는 14만 건(0.2%), 완화 시기는 20만건(0.3%)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월 20만건 안팎으로 늘었으며, 비급여 진료 추정치 5만건을 포함하면 25만건에 이른다.
전체 기간 초진 비율은 20.3%, 재진 비율은 79.7%였으며, 2024년 기준 비대면 재진 비율은 76.0%로 대면진료(69.7%)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기간 휴일·야간 진료 비율이 11.4%, 2024년 비대면은 14.6%로 대면(7.8%)의 약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기간 0~4세 6.6%, 65세 이상 28.3%였으며, 이후 시기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30.3%로 늘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많이 진료된 질환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지질대사이상(3.9%) 순이었다.
초진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등 경증 질환이 많았고, 재진은 고혈압(24.7%), 당뇨병(11.8%), 기관지염(8.6%) 순이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됐다.
2023년 6월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면 경험 기준 완화,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확대,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 등이 포함된 보완방안이 시행됐다.
2024년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시기에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제도화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 개념이므로 법적 제한보다 처방 제한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통계 부재와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의학적 가이드라인 인정과 중복규제 점검을 요구했고, 환자단체·전문가·간호·한의사단체는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제도화 필요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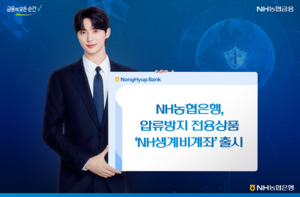

![[EE칼럼] 충분한 전력 확보 위해 시간과 공간도 고려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11.590fec4dfad44888bdce3ed1a0b5760a_T1.jpg)
![[EE칼럼] 에너지 전환의 그늘: 취약한 광물·원자재 공급망](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로봇을 막아 회사를 멈추겠다는 노조](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2026년의 각성: ‘금융 안정’의 요새와 WGBI라는 구원투수](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18.a08eb2bb1b6148bdbbc5277847497cdf_T1.jpg)
![[데스크 칼럼] 기업은 고객에, 정부는 기업에 ‘신뢰’ 줘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청년 생각하면 ‘부동산 대책 갈등’ 멈춰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2.8d2ecf4212ba46fd812906a7cabf4853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