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024 스마트건설 엑스포'에 전시된 스마트 건설장비.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즉 로봇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입·실증 단계로, 전면적인 확산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 로봇 도입은 최근 문제가 된 산업재해를 줄이는 키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비롯해 붕괴·질식 등 위험성이 따르는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또, 생산성을 향상해 균일한 품질로 건물을 시공해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술 인력 중심의 젊은 인재를 유입해 첨단 산업으로 건설업 성격도 전환할 수 있다.
로봇 활용 시 여러 장점이 따르는 만큼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도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위해 지난 28일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하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에도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자재운반 자동화 서비스 기업인 고레로보틱스와 실내 모서리, 천정, 현장 시설 등 객체 인식이 가능한 자율 도장 로봇을 개발하는 마젠타로보틱스 등도 개발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산재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정밀 가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IoT(사물인터넷)·로보틱스를 통한 재해 예측 시스템을 최근 도입했다. 로봇과 물류 운송 드론이 위험 구역을 점검, 연결된 AIoT 센서가 구조물 붕괴 조짐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삼성물산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도 작업자와 자재 동선을 분리해 충돌·낙하 사고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철골 볼트 조임 자동화 로봇을 활용 중이다. KCC도 신사업으로 도장 공정 자동화 로봇 '스마트캔버스'를 공개한 바 있다. AI와 첨단 센서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밖에 유진그룹은 지난 3월 로봇 자회사 TXR로보틱스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국내 로봇 기술 활용도는 글로벌 기준 4~5위로, 선진국 대비 80~85% 수준이다. 초기 도입 시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데다 유지 및 주기적인 보수도 필요해 영세 현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인력난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며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으로 꼽힌다. 더욱이 로봇은 콘크리트 타공 등 특정 작업에 특화된 경우가 많아 규격화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상 적용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로봇 활용 시 작업 과정이나 지침을 변경할 때 드는 비용도 건설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평가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인화·탈현장화를 추진해 2040년까지 건설 현장 인력을 30% 줄이고 생산성을 1.5배 높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IT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중국 역시 로봇 등 첨단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 정부인 선전시 등에서도 약 2조원 규모의 'AI·로봇 산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에서도 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로봇을 일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실증해 기술 활용성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가 직접 작업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 만큼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로봇 도입이 늘어나면 건설현장 프로세스 전반도 바뀌어야 하지만, 고령화와 비용 문제로 이 또한 쉽지 않다. 건설현장에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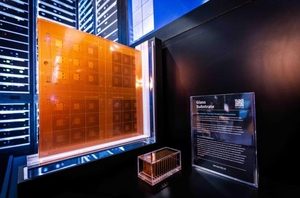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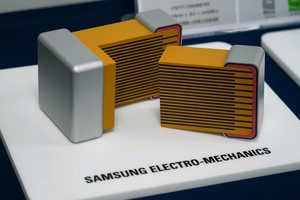





![[EE칼럼] “100% 확신은 없다: 확률예보가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유럽의 기술 중립성은 정책의 후퇴인가 진화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허무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AI는 협력자인가, 파괴자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부동산 개혁, ‘다주택자 잡기’만으로 해결 안 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0.ea34b02389c24940a29e4371ec86e7d0_T1.jpg)
![[기자의 눈] 차액가맹금 분쟁,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자양분 되길](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6.b035782046a04bd9a1758729b126396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