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내 비은행 금융사들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치불안정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변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카드사들의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을 조명해본다.

▲KB손해보험 본사 강남사옥
KB손해보험이 헬스케어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모양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 기준) 8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 성장했으나,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꼽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46억달러(약 3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29년까지 연평균 3.5% 안팎의 성장을 예상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것으로,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기술 발전과 비대면 진료 확산 등에 힘입어 주목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질병 예방을 포함한 고객 건강 관리와 맞춤형 상품 개발 등으로 보험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초 디지털전환(DT)추진본부 산하에 헬스케어지원유닛(Unit)을 구성하고,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신규 특약을 넣는 등 관련 조직을 꾸리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업계 최초로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임상 치매 등급(CDR) 검사를 연 1회 보장한다. CDR 검사는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행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서 설립한 자회사 KB헬스케어를 통해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오케어(O'CARE)도 운영 중이다. 오케어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루앤트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사업 부문도 인수했고,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들 플랫폼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자사 어플리케이션에 제휴 병원을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장착했다.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들에 답변하면 전문 의료진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받을 수 있다. 뇌 건강 점수를 확인 가능한 게임 기능도 탑재했다.
KB손해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같은 행보에 기여하는 요소다. 경쟁력 있는 상품군에 더 힘을 싣는 전략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KB손해보험의 장기보험손익(9960억원)은 전체 보험손익(9780억원) 보다 컸다. 일반보험의 적자폭이 커지고, 자동차보험도 수익성이 급감한 탓이다. 반면, 장기보험손익은 23.7% 증가했다. 2023년에는 장기보험 비중이 96.8% 수준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올 4월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도 0.9% 인하하는 만큼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손해율도 지난해 평균 83.65%까지 높아졌다. 업계가 생각하는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한 셈이다. 2021부터 2023년까지는 8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023년말 200%를 상회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무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 변경 등으로 지난해말 188.1%로 낮아졌고,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도 언급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시장금리 상승이 어려운 만큼 영업적인 측면에서 체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고객이 많아지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계약유지율 하락을 방지하고, 고객 기반 확장도 노려볼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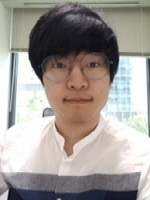


![[주간 신차] 벤틀리·BMW·쉐보레·KGM…럭셔리와 실용의 경계를 허물다](http://www.ekn.kr/mnt/thum/202507/news-p.v1.20250711.4d37daed6c5d40f4b6767dd47f35c564_T1.jpg)









![[EE칼럼] 새정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 성공 조건](http://www.ekn.kr/mnt/thum/202507/news-a.v1.20240904.0066f456bc57489fb8c9d7d3379d316e_T1.jpg)
![[신연수 칼럼] 이재명의 경제정책, 출발은 좋은데…](http://www.ekn.kr/mnt/thum/202507/news-p.v1.20250708.38f9384c6c284c0a8972d26a943c5cda_T1.jp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안철수의 사퇴: 혁신을 위한 ‘수단’과 ‘도구’의 부재](http://www.ekn.kr/mnt/thum/202507/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사자’가 된 이재명에게 거는 기대](http://www.ekn.kr/mnt/thum/202507/news-p.v1.20250706.13bef94ea2f743409f554b82e1e4b724_T1.jpg)
![[기자의 눈] 중국 공세, 물량보다 자본이 더 무섭다](http://www.ekn.kr/mnt/thum/202507/news-p.v1.20250708.db95fe142a5a42bea2d2f69b7e3d6ac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