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 정책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대응책을 함께 모색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산업 대표들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이 19~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에서 26명이 모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민규 신세계 부사장, 구동휘 LS엠앤엠 사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허진수 SPC 사장,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등이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은 트럼프 1기 '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전했다. 사절단은 우선 19일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Great Hall)에서 'Korea-US Business Night'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도 펼쳐진다. 20일에는 미국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을 소개할 방침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아웃리치 활동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 정부·의회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르포] “갤럭시 S25 AI 기능 ‘그림의 떡’ 이라면 이곳으로”](http://www.ekn.kr/mnt/thum/202502/news-p.v1.20250213.9f8041bf4a7b47438ec0326c6a9a2686_T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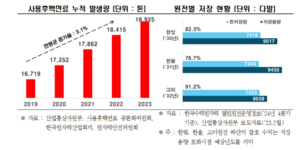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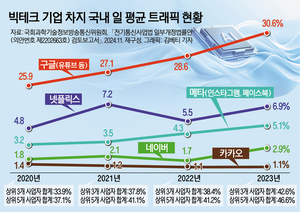


![[EE칼럼]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T1.jpg)
![[이슈&인사이트] 국민연금 당면과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치 기반 구축이다](http://www.ekn.kr/mnt/thum/202504/news-p.v1.20240221.166ac4b44a724afab2f5283cb23ded27_T1.jpg)
![[김병헌 칼럼]서민경제, 더욱 잔인한 4월이 오는가?](http://www.ekn.kr/mnt/thum/202503/news-a.v1.20240625.632a59702fa1403793738702bdf2322a_T1.jpg)
![[기자의 눈] ‘대립’에서 ‘대화’로…주총장의 바뀐 공기](http://www.ekn.kr/mnt/thum/202504/news-p.v1.20250402.c35f621938604384a8261b81d1d0715c_T1.png)